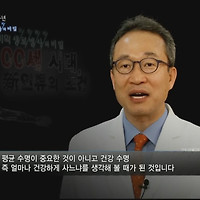제주에 살면서 알게 된 두 분이 금년에 운명을 달리했다.
그 분들은 제주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동서 형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들이 행사에 참석하시기도 했고, 노래방에 같이 가서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었다.
44년생인 남자 분은 젊었을 때, 제주로 내려온 분이다. 돈이 꽤 든다는 ○○ 향우회 지역 회장을 맡을 정도니까, 젊었을 때는 소위 한 끗발(?) 하신 분인지도 모르겠다. 지역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으로 자식들도 다 여위고 대여섯 살 차이 나는 부인과 살았다. 향우회 지역회장 취임식 때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에피소드도 있을만큼 술도 좋아했다.
노래방에서 그 분의 애창곡은 '천년을 빌려준다면'이었다.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 너무 사랑하고 ♪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해주고 싶어~~
마이크를 잡고 구성지게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집에도 가보았다. 아담한 이층집이었는데 건축회사 출신답게 사는 집도 직접 지었다고 했다. 노래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금슬이 좋아 보여서, 잘 모르는 내 생각에도 사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 그 분이 작년에 건강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받았고, 오래 전 수술로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하여 다른 장기에 전이된 상태로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일 년 정도 더 살다가 금년 봄에 운명을 달리 했던 것이다.
평소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동서형님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6개월 시한부 생명 진단을 받은 후에는 매일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만날 때마다 울어서 찾아 가기도 민망하다는 거다. 내가 그 분과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니 잘은 모르겠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직하는 것이 억울하고 야속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 처형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다. 처형과 그분의 부인은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기도 했다.
-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 엄마도 같이 모시려고 부부용 납골당을 구입했데. 그런데 걔가 그걸 알고 자식들에게 당장 가서 물르라고 야단을 쳤다는군. 내가 평생을 저 영감탱이하고 살면서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까지 영감탱이와 같이 지내라는 말이냐고, 참내.
젊어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는군.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담당했었데. 그러니까 매일 술에, 계집질에, 집에는 며칠씩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랬다는 거야. 에휴, 그러니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
47년생인 여자 분은 제주 출신으로 유지이다. 평생 교직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교감으로 은퇴한 후 소설도 몇 권 집필한 분이었다. - 이 글을 쓰는 동안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쓴 것이라며 책을 한 권 주었었는데 몇 페이지 읽다 말았고 지금은 어디에 처박아 두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에고 한심한 자식.
처음 만나 뵈었을 때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한 달에 한 두 번 서울의 큰 병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제주대학 병원에도 암 병동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의 큰 병원이 낫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다니던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방법은 큰 차이가 없으니 서울로 왔다 갔다 고생하시지 말고, 제주에서 치료를 하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제주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그 분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방사선 치료로 머리가 빠져 항상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던 그 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환자인지도 모를만큼 의연하게 행동했다. 소설가답게 객관적 관찰력도 뛰어나서 유머를 섞어가며 제주 괸당문화의 문제점을 말해주던 것은 아주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난다. (제글 '제주를 흉보다' 참조)
미국에서 돌아온 후, 장례식에 참석했던 동서가 말해주었다.
- 끝까지 의연하게 계시다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며칠 안 남았다고 하기는 했었어. 내가 돌아가시기 전 날에도 병문안을 갔었거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날 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머금으시더라구. 어떻게 그렇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 자식들이 모두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셨으니까.
ㅇ사장은 내가 다녔던 회사의 초대사장이었다. 모회사에서 전무로 퇴직을 하고나서, 자회사의 사장으로 온 분이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대학선배이자 옛날 직장상사이었던 분을 만나 점심을 같이 했던 자리에서 였다. 6년 전이었지만 선배는 정년퇴직을 하고 어떤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너도 알지, ㅇ사장. 그 양반이 키는 나처럼 작아도, 작은 거인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강직하고 원칙을 지켰던 분이야. 내가 대구에서 부장을 할 때, 그 분이 지점장을 했으니까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고 가깝게 지냈거든. ㅇ사장이 얼마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는데, 장기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옛날에 ㅇ사장에게 신세진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장기이식 하라고 1억원을 그냥 주었어.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죽더라고.
내가 아는 한 그 양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가 보더라. 나도 그럴까?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
'은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 (0) | 2013.11.04 |
|---|---|
| 한국, 믿지 마세요! (1) | 2013.11.04 |
| 장수(長壽)와 건강 (0) | 2013.11.01 |
| 한국에서 병원가기 2 (0) | 2013.11.01 |
| 한국에서 병원가기 1 (0) | 2013.11.01 |